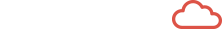[불교신문] 60년 도반, 불교신문이 달라지는구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정사 지킴이 작성일19-07-04 09:32 조회1,558회 댓글0건본문
“60년 도반, 불교신문이 달라지는구나”
‘창간 60주년 맞이 특별기획’
불교신문은 나의 도반 - 월정사 회주 현해스님
최근 소리 없이 총무원 방문
성역화불사ㆍ승려복지와 함께
불교신문 법보시 기금 ‘기탁’
“난 이제 늙어서 힘이 부쳐
대신 포교해 달라는 뜻이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불교신문은 모든 사람이
부처임을 알게 해주는 ‘방편’
“서로가 부처임을 인정할 때
그때가 평화세상 아니겠어요”
올해 우리 나이 여든 다섯의 원로 현해스님은 요즘 위장은 70%만 채우고 정기적으로 걷는다. 누가 찾아오더라도 가능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붓글씨를 쓴다. ‘雖道得 行不得(수도득 행부득)’. 회향이 좋은 선배들은 모든 것을 잘 내려놓은 분들이었다는 기억을 전해주는 스님 모습에서 원로 스님의 모습이 더 크게 느껴진다. 신재호 기자
10년 임기의 원로의원 역임한 월정사 회주 현해스님이 지난 5월17일 총무원을 방문해 불교신문 법보시 기금 500만원을 내놓았다. 뿐만이 아니라 조계종 총본산성역화 불사와 승려노후복지 기금에 보태라고 각각 500만원을 보시했다. “포교와 종단불사, 승려복지에 후원을 하고 싶어 상좌들과 신도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가져왔다”며 남긴 스님의 말씀은 담당 실무자들을 숙연케 했다.
스님은 올해 우리나이로 여든 다섯.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불교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이같은 후원을 결심했다. 정화불사를 하면서 선배 스님들이 강조했던 3가지 가운데 교육과 역경은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포교는 불자감소로 오히려 뒷걸음 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불교 미래를 책임질 젊은 불자들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청년포교방법을 고민하던 스님은 군법당을 떠올렸다.
매주 청년들이 찾아오는 군법당에 불교신문을 보내 장병들이 쉽게 불교를 접하고 배우면 좋을 것이란 생각에서 법보시를 결정한 것이다. 불교신문 법보시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본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평소 언론과의 접촉을 반기지 않는 스님의 성품을 알기에 깊은 속내가 궁금했다. 6월20일 월정사 서울포교원 법종사에서 스님을 만나 그 이유를 들었다. 스님은 건강검진 일정을 연기하고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과 기자를 싫어한다”는 스님은 <불교신문> 60년 독자이자 도반이었다. 일본유학 시절을 제외하곤 늘 불교신문과 함께 해왔다. 본지 불교신문은 1960년 1월1일 <대한불교> 이름으로 창간돼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스님은 1958년 ‘오대산 도인(탄허스님)’을 만나러 월정사로 입산했다 만나지 못하고 그 이듬 해 그의 상좌인 희찬스님을 은사로 정식 출가했다. 해당 월일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내진 못하지만 스님은 불교신문에 대한 몇 가지 깊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내가 처음 중 됐을 무렵일 거야. 그땐 <대한불교>라 했던가, 월간지였지? 월정사로 우송이 돼 왔어. 그걸 내가 늘 탐독했거든.” 스님이 아직도 그 당시를 기억하는 건 한 대학교수의 시비에 대한 총무원 소임자의 명쾌한 반박기고 때문이다.
“김영수라는 동국대 교수가 어느 언론에 글을 실었어. 부처님도 (출가 전에)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왜 자꾸 비구’라 그러느냐, 종단에서는 왜 자꾸 비구승, 독신승을 주장하느냐고 실은 거야. 경산스님이 총무원에서 무슨 부장 소임을 보고 있을 때인데 그 글에 대한 반박 글을 불교신문에 몇 차례 실었어. ‘신(信)은 공덕의 어머니고, 신(信)으로 인해서 도(道)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부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감히 불자라 할 수 있느냐’ 첫 대목에 그렇게 나와 있어. 지금도 잊히지 않아. 부처님 제자라면 속인이든 출가자든 간에 스스로 노력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뿌리 깊이 믿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젊은 소임자들은 그와 같은 신심이 뼛속 깊이 박혀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꾸 걱정이 된다”며 스님은 불교신문의 역할을 함께 새겨보자고 했다.
“내가 왜 기자와 경찰을 싫어하느냐? 항상 남의 좋은 점보다 잘못된 점을 캐내려 한단 말이지. 꼭 사람의 나쁜 점을 파내려 하는 게 (직업)속성이 아니냐고? 그래서 불교계 언론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럼에도 스님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래 신문이란 두 가지 역할이 있어. 뉴스전달과 국민선도. 불교신문도 마찬가지거든. 종단(사찰)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포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포교를 하려면 뭘 다뤄야 되겠어요? 물론 부처님말씀도 전해야겠지.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거든. 하지만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처’가 돼야 하거든. 스스로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게끔 불교신문이 중생들을 이끌어가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얼마 전까지 불교신문을 보면 스님들의 무슨 부정적인 면을 거침없이 다루고 있거든. 그게 과연 (앞에 말한) 불교신문의 목적이 얼마나 부합하느냔 말이야? 그런데 다행스런 게 있더라고. 근래 와서 찬찬히 살펴보니 별로 이름도 크게 알려지지 않은 스님들의 수행 장면, 옛날 스님들의 수행기록들을 주~욱 실고 있더구먼. 그래 아! 아제 불교신문이 달라지는 구나, 불교신문이 본래 목적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내 맘에 들든 안 들든 불교신문은 종단기관지입니다. 우리 한국불교 각 종단에서도 신문을 내지만 불교신문이 제일 낫습니다. 필진도 낫고 내용도 확실히 다릅니다.” 스님은 이한상 사장 시절 불교신문의 위상을 한껏 제고시켰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차담을 이어갔다.
스님은 외도들이 부처님을 흠집 내기 위해 손타리는 여성의 임신설을 유포했던 사건 등을 예로 들어가며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 비일비재 하겠지만 불교신문만은 과도한 표현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중생을 어떻게 포교해서 제도할 것인가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죠. <법화경>에 대해서도 물었죠?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포섭한다는 뜻의 섭문(攝門), 하나는 자른다는 의미가 담긴 절문(折門). 섭문은 ‘방편문’ 혹은 ‘자비문’이라고도 합니다. 절문은 다른 말로 ‘지혜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바세계는 우방편 좌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부처님일 때는 우보현ㆍ좌문수 보살이거든. 좌는 체(體), 우는 용(用). 지혜를 바탕으로 중생을 교화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바세계에서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다 잘라 버리면 중생이 들어설 문이 없어.”
스님은 자신과 생각이 사상이 다르더라도 일단 받아들여 공감대를 넓혀가는 게 곧 포교라며 불교신문의 역할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화경 신해품(信解品)의 장자궁자(長者窮子)의 비유도 들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교화하기 위해 좋은 옷도 벗어버리고 먼지까지 덮어쓰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 ‘부처님의 자비’라며 불교신문도 그런 방편을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화경요품 강의>, <묘법연화경>(3권), <한국불교와 법화사상> 등의 저서가 말해주듯 현해스님은 <법화경> 대가라 할 수 있다. 법화경을 전공하게 된 동기 또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인연법으로 비유로써 일일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그 가운데서도 ‘상불경품(常不輕品)’을 특히 좋아해 법문 때도 자주 인용한다.
“상불경 보살이 있는데 이 보살이 왜 ‘상불경’이냐? 항상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길거리서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존경한다 하면 기분이 좋지만 금방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라. 보는 사람마다 부처님이라 하니 ‘미친놈’이라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상불경 보살은 도망가면서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그 구박하던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서 과보를 받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상불경보살의 법문을 듣고 부처가 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어 다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인간성을 부인하고 물질과 권력만을 좇기 위해 사람을 대하는 것은 결국 과보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상불경 보살의 법문을 듣고 깨치면 이 세상은 바로 부처님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가 곧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한 ‘천상천하유아독존’, 그 말씀이며 그것이 불교의 특징이고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상불경 보살이 한 것처럼 인간이 부처이니,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 서로가 부처님임을 인정한다면 평화세상이 아니겠어요. 상대를 내 권력지향의 상대로만 생각하면 지옥이 되는 것이고, 돈의 상대로만 생각하면 부모도 자식도 적이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요즘 중국 당나라 시대 도림선사와 백거이의 문답을 즐겨 쓴다. “백거이가 먼저 묻죠.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 도림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거라면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것 아닙니까?’라고 백거이가 반문하니, 도림선사가 다시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알지만 팔십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시대 중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불교신문이 감동적인 비유와 설법을 많이 담아주세요.”
‘雖道得 行不得(수도득 행부득)’. 창간60주년을 맞이한 불교신문에도 어울릴 것 같다며 스님이 기자에게 들어 보인 휘호 가운데 한 편이다. 회고록 편찬과 한지로 된 우리말법화경 사경집 발행. 스님의 두 가지 원력이 꼭 성취되길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불교신문은 나의 도반 - 월정사 회주 현해스님
최근 소리 없이 총무원 방문
성역화불사ㆍ승려복지와 함께
불교신문 법보시 기금 ‘기탁’
“난 이제 늙어서 힘이 부쳐
대신 포교해 달라는 뜻이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불교신문은 모든 사람이
부처임을 알게 해주는 ‘방편’
“서로가 부처임을 인정할 때
그때가 평화세상 아니겠어요”
올해 우리 나이 여든 다섯의 원로 현해스님은 요즘 위장은 70%만 채우고 정기적으로 걷는다. 누가 찾아오더라도 가능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붓글씨를 쓴다. ‘雖道得 行不得(수도득 행부득)’. 회향이 좋은 선배들은 모든 것을 잘 내려놓은 분들이었다는 기억을 전해주는 스님 모습에서 원로 스님의 모습이 더 크게 느껴진다. 신재호 기자
10년 임기의 원로의원 역임한 월정사 회주 현해스님이 지난 5월17일 총무원을 방문해 불교신문 법보시 기금 500만원을 내놓았다. 뿐만이 아니라 조계종 총본산성역화 불사와 승려노후복지 기금에 보태라고 각각 500만원을 보시했다. “포교와 종단불사, 승려복지에 후원을 하고 싶어 상좌들과 신도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가져왔다”며 남긴 스님의 말씀은 담당 실무자들을 숙연케 했다.
스님은 올해 우리나이로 여든 다섯.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불교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이같은 후원을 결심했다. 정화불사를 하면서 선배 스님들이 강조했던 3가지 가운데 교육과 역경은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포교는 불자감소로 오히려 뒷걸음 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불교 미래를 책임질 젊은 불자들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청년포교방법을 고민하던 스님은 군법당을 떠올렸다.
매주 청년들이 찾아오는 군법당에 불교신문을 보내 장병들이 쉽게 불교를 접하고 배우면 좋을 것이란 생각에서 법보시를 결정한 것이다. 불교신문 법보시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본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평소 언론과의 접촉을 반기지 않는 스님의 성품을 알기에 깊은 속내가 궁금했다. 6월20일 월정사 서울포교원 법종사에서 스님을 만나 그 이유를 들었다. 스님은 건강검진 일정을 연기하고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과 기자를 싫어한다”는 스님은 <불교신문> 60년 독자이자 도반이었다. 일본유학 시절을 제외하곤 늘 불교신문과 함께 해왔다. 본지 불교신문은 1960년 1월1일 <대한불교> 이름으로 창간돼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스님은 1958년 ‘오대산 도인(탄허스님)’을 만나러 월정사로 입산했다 만나지 못하고 그 이듬 해 그의 상좌인 희찬스님을 은사로 정식 출가했다. 해당 월일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내진 못하지만 스님은 불교신문에 대한 몇 가지 깊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내가 처음 중 됐을 무렵일 거야. 그땐 <대한불교>라 했던가, 월간지였지? 월정사로 우송이 돼 왔어. 그걸 내가 늘 탐독했거든.” 스님이 아직도 그 당시를 기억하는 건 한 대학교수의 시비에 대한 총무원 소임자의 명쾌한 반박기고 때문이다.
“김영수라는 동국대 교수가 어느 언론에 글을 실었어. 부처님도 (출가 전에)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왜 자꾸 비구’라 그러느냐, 종단에서는 왜 자꾸 비구승, 독신승을 주장하느냐고 실은 거야. 경산스님이 총무원에서 무슨 부장 소임을 보고 있을 때인데 그 글에 대한 반박 글을 불교신문에 몇 차례 실었어. ‘신(信)은 공덕의 어머니고, 신(信)으로 인해서 도(道)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부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감히 불자라 할 수 있느냐’ 첫 대목에 그렇게 나와 있어. 지금도 잊히지 않아. 부처님 제자라면 속인이든 출가자든 간에 스스로 노력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뿌리 깊이 믿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젊은 소임자들은 그와 같은 신심이 뼛속 깊이 박혀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꾸 걱정이 된다”며 스님은 불교신문의 역할을 함께 새겨보자고 했다.
“내가 왜 기자와 경찰을 싫어하느냐? 항상 남의 좋은 점보다 잘못된 점을 캐내려 한단 말이지. 꼭 사람의 나쁜 점을 파내려 하는 게 (직업)속성이 아니냐고? 그래서 불교계 언론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럼에도 스님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래 신문이란 두 가지 역할이 있어. 뉴스전달과 국민선도. 불교신문도 마찬가지거든. 종단(사찰)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포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포교를 하려면 뭘 다뤄야 되겠어요? 물론 부처님말씀도 전해야겠지.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거든. 하지만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처’가 돼야 하거든. 스스로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게끔 불교신문이 중생들을 이끌어가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얼마 전까지 불교신문을 보면 스님들의 무슨 부정적인 면을 거침없이 다루고 있거든. 그게 과연 (앞에 말한) 불교신문의 목적이 얼마나 부합하느냔 말이야? 그런데 다행스런 게 있더라고. 근래 와서 찬찬히 살펴보니 별로 이름도 크게 알려지지 않은 스님들의 수행 장면, 옛날 스님들의 수행기록들을 주~욱 실고 있더구먼. 그래 아! 아제 불교신문이 달라지는 구나, 불교신문이 본래 목적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내 맘에 들든 안 들든 불교신문은 종단기관지입니다. 우리 한국불교 각 종단에서도 신문을 내지만 불교신문이 제일 낫습니다. 필진도 낫고 내용도 확실히 다릅니다.” 스님은 이한상 사장 시절 불교신문의 위상을 한껏 제고시켰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차담을 이어갔다.
스님은 외도들이 부처님을 흠집 내기 위해 손타리는 여성의 임신설을 유포했던 사건 등을 예로 들어가며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 비일비재 하겠지만 불교신문만은 과도한 표현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중생을 어떻게 포교해서 제도할 것인가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죠. <법화경>에 대해서도 물었죠?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포섭한다는 뜻의 섭문(攝門), 하나는 자른다는 의미가 담긴 절문(折門). 섭문은 ‘방편문’ 혹은 ‘자비문’이라고도 합니다. 절문은 다른 말로 ‘지혜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바세계는 우방편 좌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부처님일 때는 우보현ㆍ좌문수 보살이거든. 좌는 체(體), 우는 용(用). 지혜를 바탕으로 중생을 교화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바세계에서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다 잘라 버리면 중생이 들어설 문이 없어.”
스님은 자신과 생각이 사상이 다르더라도 일단 받아들여 공감대를 넓혀가는 게 곧 포교라며 불교신문의 역할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화경 신해품(信解品)의 장자궁자(長者窮子)의 비유도 들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교화하기 위해 좋은 옷도 벗어버리고 먼지까지 덮어쓰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 ‘부처님의 자비’라며 불교신문도 그런 방편을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화경요품 강의>, <묘법연화경>(3권), <한국불교와 법화사상> 등의 저서가 말해주듯 현해스님은 <법화경> 대가라 할 수 있다. 법화경을 전공하게 된 동기 또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인연법으로 비유로써 일일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그 가운데서도 ‘상불경품(常不輕品)’을 특히 좋아해 법문 때도 자주 인용한다.
“상불경 보살이 있는데 이 보살이 왜 ‘상불경’이냐? 항상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길거리서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존경한다 하면 기분이 좋지만 금방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라. 보는 사람마다 부처님이라 하니 ‘미친놈’이라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상불경 보살은 도망가면서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그 구박하던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서 과보를 받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상불경보살의 법문을 듣고 부처가 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어 다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인간성을 부인하고 물질과 권력만을 좇기 위해 사람을 대하는 것은 결국 과보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상불경 보살의 법문을 듣고 깨치면 이 세상은 바로 부처님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가 곧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한 ‘천상천하유아독존’, 그 말씀이며 그것이 불교의 특징이고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상불경 보살이 한 것처럼 인간이 부처이니,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 서로가 부처님임을 인정한다면 평화세상이 아니겠어요. 상대를 내 권력지향의 상대로만 생각하면 지옥이 되는 것이고, 돈의 상대로만 생각하면 부모도 자식도 적이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요즘 중국 당나라 시대 도림선사와 백거이의 문답을 즐겨 쓴다. “백거이가 먼저 묻죠.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 도림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거라면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것 아닙니까?’라고 백거이가 반문하니, 도림선사가 다시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알지만 팔십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시대 중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불교신문이 감동적인 비유와 설법을 많이 담아주세요.”
‘雖道得 行不得(수도득 행부득)’. 창간60주년을 맞이한 불교신문에도 어울릴 것 같다며 스님이 기자에게 들어 보인 휘호 가운데 한 편이다. 회고록 편찬과 한지로 된 우리말법화경 사경집 발행. 스님의 두 가지 원력이 꼭 성취되길 마음속으로 빌어본다.